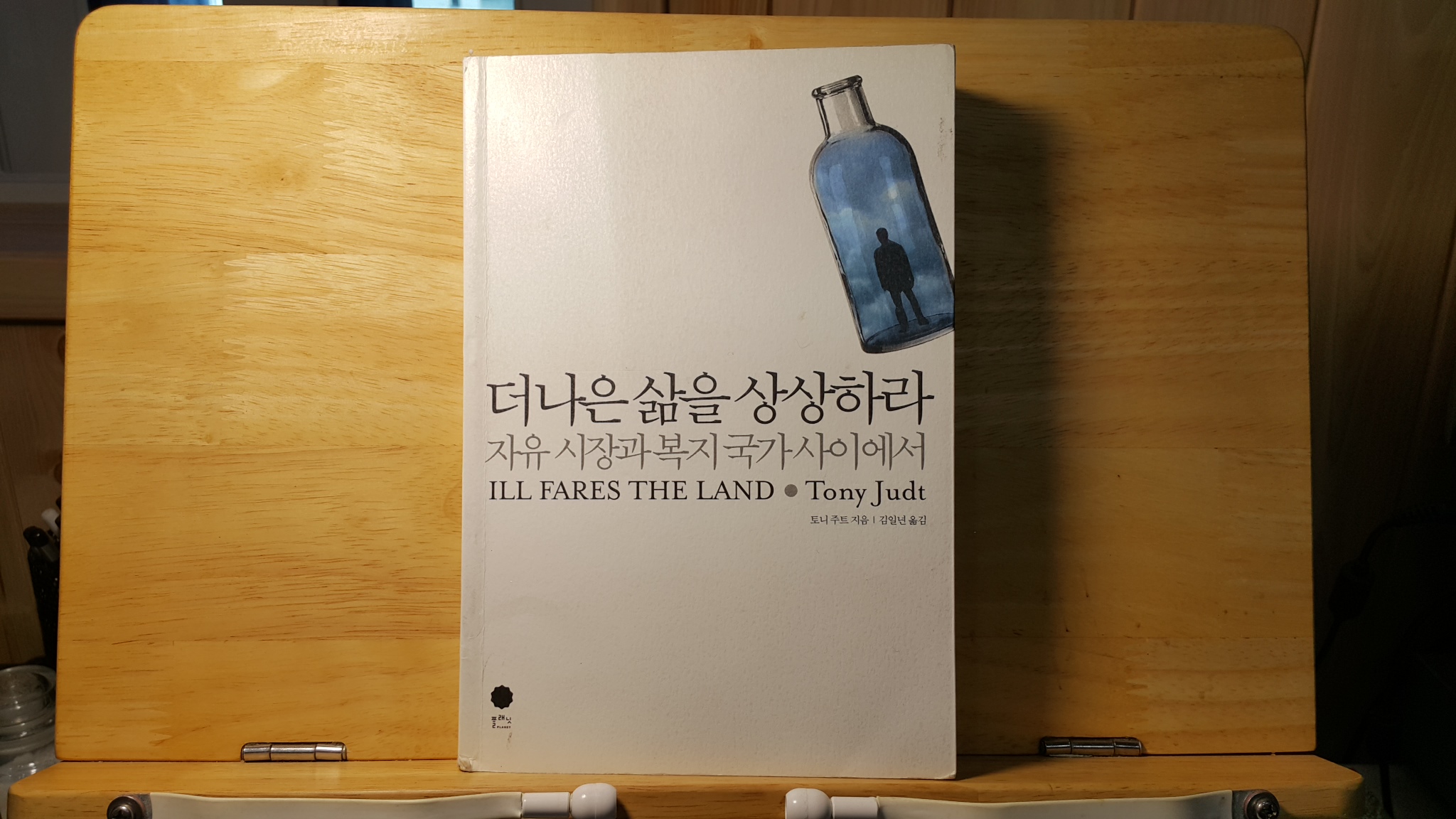
토니 주트 지음, 김일년 옮김,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플래닛, 2011.
원제는 'Ill Fares The Land'이다. 무슨 뜻인지 사전을 한참 찾아봤는데 'The land fares ill(땅이[사회가] 잘못 되어가가고 있다)'를 도치시킨 것 같다.
저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신자유주의적 풍토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가 크게 발전했다. 복지국가는 많은 국가들에서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을 크게 이루어 내었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성과들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자는 그러한 불만은 복지국가의 성공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한다. 가난할 때는 몰랐는데 좀 잘 살게 되니까 사생활 보호, 소음, 환경 등에 대한 이런저런 불만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다. 때로는 비효율적이더라도, 국가는 불평등 심화를 비롯하여 신자유주의 질서가 악화시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기대가 되었는데 한참 미치지 못했다. 주장은 난무하는데 논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문단이 구체적인 근거나 사례를 들지 않고 자기의 주장과 관점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우리는 공공의 책무가 공동체의 이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민간 부문으로 이전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해 오고 있다. 경제이론과 대중적인 신화와는 반대로, 민영화는 비효율적이다. 정부가 민간 부문에 넘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업들의 대부분은 적자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철도 회사든, 광산이든, 우편 사업이든, 혹은 에너지 관련 공익사업이든, 이 사업들은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기대되는 수입보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썼다. (115쪽)
민영화된 철도, 광산, 우편사업 등이 실제로 적자를 내고 있고 그것이 상식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보여주지 않아서 '민영화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다른 문단들도 '다들 아시다시피'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논증을 하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도시에 들어선 훌륭한 철도역, 필요한 상품을 잔뜩 쌓아놓은 쇼핑센터, 그리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자리한 우체국 등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을에 훌륭한 운동장이 들어서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도록 우리가 비용을 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가 십시일반 내는 세금에 의한 방법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물론 우리 중에는 무임승차자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껏 그 누구도 개인의 욕망들을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한데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낸 적은 없다.
현실적인 법안에 대해 논의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개개인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되지 않는 분야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시장과 사적 이익의 자유로운 발휘가 명백히 공동의 목표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정부가 개입해야 할 때는 언제인지 알 필요가 있다. (206~207쪽)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낸 적은 없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는가? 설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더라도, 이 책을 읽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그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논증을 하지 않는다. 그저 "'보이지 않는 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선언할 뿐이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겠는데, 저자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글에 설득 당할 수 있겠는가?
저자는 유럽 현대사를 다룬 《포스트워》로 유명한 사람이다. 이미 그 책에서 사실과 사례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생략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의 구성과 전개에 체계성이 없다. 나이 많은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생각나는 대로 하는 느낌이다. 독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의미있는 주제를 다루려 했으나 준비도 안 했고 조급했다. '글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교훈 말고는, 읽고 나서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셰리 버먼의 《정치가 우선한다》를 추천한다. 같은 주제,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지만 훨씬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며, 유익하고 재미있다.
'나의 서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건축학개론》 (0) | 2023.03.09 |
|---|---|
| 《주대환의 시민을 위한 한국현대사》 (1) | 2023.02.02 |
| 《건축학교에서 배운 101가지》 (0) | 2021.01.19 |
| 《정치가 우선한다》 (0) | 2021.01.13 |
|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0) | 2020.12.27 |



